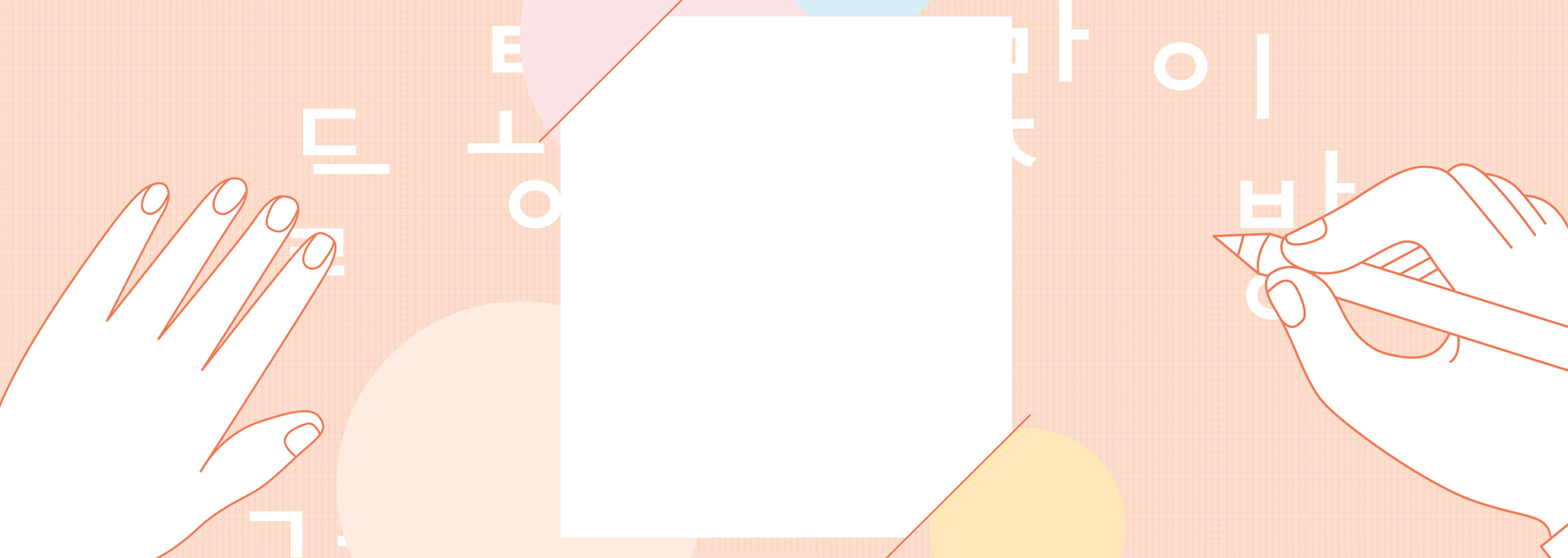
 어제, 기억하기
어제, 기억하기-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 들통나다 • 맞이방 • 전단지 • 견제 | 우리나라는 지난했던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근대 문물을 일본에서 받아들여야 했기에 광복을 맞은 뒤 펴낸 국어사전에도 일본식 한자어가 많다. ‘철학, 추상, 관념, 명제, 정당, 철도, 학위’ 같은 일본식 한자어가 그러한 말들이다. 이 외래어들은 대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뽀록나다, 대합실, 찌라시, 겐세이’ 같은 일본어는 얼마든지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다. 자연스럽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외래어라면 하나씩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꾸어 가는 것은 어떨까. 소중한 독자의견을 기반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이렇게 바꿔요」는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있는 일본어식 표현 등 외래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바로 잡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글. 이승훈(동아일보 어문연구팀 차장)
뽀록나다는 우리말 아닌 게 ‘들통났네’?
- ‘대질시켜 보면 뽀록날 테니까, 대기실에 들어가 있어.’
- -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중에서
‘뽀록나다’라는 말은 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 ‘뽀록’은 일본어 ‘보로(ぼろ·襤褸)’에서 왔다고 한다. ‘보로’는 ‘넝마, 누더기, 고물’이란 뜻에다 ‘허술한 데, 결점’이란 의미가 덧붙었다. 그래서 ‘보로가 데루(ぼろを だ(出)す)’라고 하면 ‘단점이나 결점을 드러내다, 실패하다’라는 의미다. ‘보로’ 가 우리말에 들어와 ‘뽀록이 나다’, ‘보로터지다’로 쓰이고 있다. 보로터지다란 말은 필자도 처음 들어본 생소한 말이다.
한편, 당구 용어에서 ‘요행수’를 일컬을 때도 ‘뽀록’이라고 한다. 영어 ‘fluke’의 일본식 발음 ‘후루쿠(フルク)’가 변한 것이라고 한다. ‘보로’나 ‘후루쿠’ 둘 다 일본말이니 ‘뽀록나다’, ‘보로터지다’는 말 대신 국립국어원이 다듬어 놓은 ‘들통나다’, ‘드러나다’를 활용하는 게 좋다.
대합실 아닌 ‘맞이방’에서 정다운 사람을 만나자
-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 - 곽재구 시 「사평역(沙平驛)에서」 중에서
시 ‘사평역에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대합실’은 일본식 한자어다. ‘마치아이시쓰(まちあいしつ)’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공공시설에서 손님이 기다리며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한 곳’이라는 뜻풀이와 ‘공항 대합실, 대전역 대합실’이란 용례가 실려 있다.
서울역 대합실이 ‘맞이방’으로 바뀐 건 오래됐다. 철도청 (현 한국철도공사)의 요청으로 국어순화사업을 벌인 국어문화운동본부가 2004년 내놓은 결과물 중 하나다. 그 이후 경부선과 호남선의 주요 역 대합실은 명칭이 맞이방으로 바뀌었다.
‘맞이하다’는 새해나 봄, 손님이나 친구를 맞이하거나, 아내나 남편, 며느리나 사위를 예를 갖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지녔다. 그러기에 희망과 설렘, 기쁨과 행복을 동반하는 결이 고운 말이 아닐까 싶다. 우리 모두 대합실 말고, ‘맞이방’에서 정다운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찌라시 말고, ‘전단지’를 뿌리자
‘◯◯◯ 열애설 찌라시…’, ‘증권가 테마주 찌라시 유포 60대 벌금형’, ‘최모 씨 코로나19 음성… 찌라시에 기가 막혀’.
‘찌라시’라는 일본어투가 요즘 들어 부쩍 눈에 띈다.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찌라시’를 치면 연예계와 증권가는 물론이고 국회, 뉴스 기사의 제목 등에도 숱하게 나온다.
이쯤 되면 ‘찌라시’를 거침없이 쓰는 듯하다. 찌라시는 일본어 ‘지라시(ちらし(散 らし)’에서 온 말이다. 지라시는 ‘흩뿌리다, 퍼뜨리다’는 뜻의 동사 ‘지라스’에서 나왔으며, 선전하기 위해 만든 종이쪽지를 말한다. 유흥음식점이 밀집한 번화가에 어지러이 흩뿌려지거나 신문지에 끼워져 배달되는 광고 전단, 전문 정보꾼들이 떠도는 소문을 모아 파는 증권가 사설 정보지를 일컬을 때도 쓰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지라시’를 표제어로 올려놓았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찌라시’를 올려놓았다. 비록 사전에 오른 말이라 해도 저속한 느낌을 주므로 ‘낱장광고, 광고전단, 선전지, 사설 정보지’로 순화해 써보자.
겐세이를 ‘견제’하자
“차분하게 (질의) 하는데 중간에서 겐세이 놓으시는 것 아닙니까.”
2018년 국회, 한 회의에서 모 의원이 설전을 벌이다 중재에 나선 위원장에게 한 말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것 도 3·1절을 앞두고 속된 일본어를 써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다른 여야 의원 두 사람도 “겐세이 놓고 끼어들면 길어지니까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로 공방을 벌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겐세이(けんせい)’는 ‘견제(牽制)’를 속되게 이르는 일본말이다. 당구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개 삼아 많이 쓰며 게임 용어로도 자주 쓰인다.
상대방이 집중해서 경기를 잘하지 못하게 훼방 놓거나 방해 할 때, 혹은 대화 도중에 제3자가 참견하듯 끼어들 때 쓰는 이 말은 사적인 자리에서야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선 쓰지 않는 게 이롭다. ‘겐세이’를 잘못 썼다간 체면이 깎이겠지만, ‘견제, 훼방, 방해, 수비’ 같은 우리말을 적절히 골라 쓰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