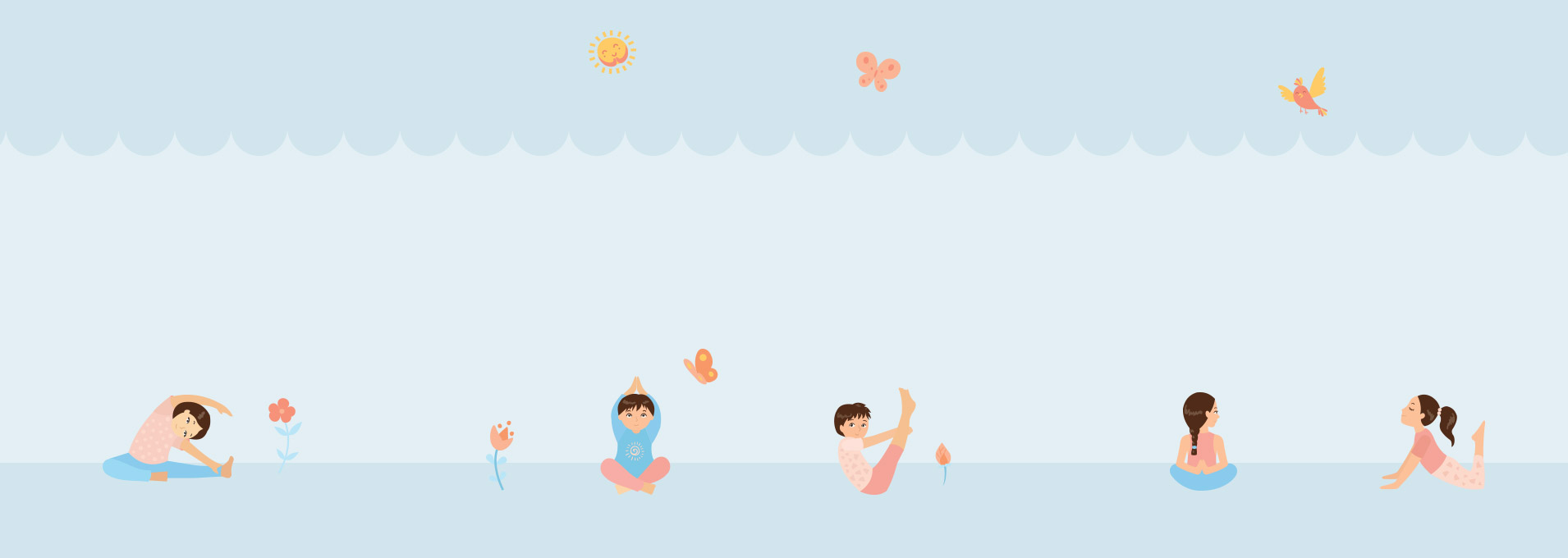
 어제, 기억하기
어제, 기억하기- 에세이
학교야, 요가 하자
「에세이」는 교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공감 에세이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코너입니다.※정아령 선생님은 ‘빛율샘’이라는 이름으로 요가, 뮤지컬, 글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자기수용과 자기표현을 돕고 있는 교실 예술가입니다.
- 글. 정아령(구름산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얘 좀 보세요! 우와~ 대~박!!”
아침부터 아이들이 매트 위에서 요가를 하며 놀고 있다. 사랑스러운 풍경이다. 요가동아리 아이들이었다. 자세의 이름을 알거나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방법으로 몸을 써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지난해 척추측만증으로 병원에 다니는 아이가 우리 반에 두 명이나 있었다. 한 명은 아예 허리 보호장구를 차고 수업을 들었다. 척추 측만증과 거북목, 일자목 증후군이 흔한 것은 개인의 문제일까. 불편한 의자에 아이들을 너무 오랫동안 앉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른! 자세!”를 입에 달고 살았다. 바르게 앉고 서는 방법을 틈나는 대로 세세하게 알려주었다. 잘못된 자세 습관과 운동 부족은 잔소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체육은 대체로 피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쟁형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아이들이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기에는 부족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는다. 학교가 좀 더 유연해지면, 아이들도 좀 더 말랑해지지 않을까. 상처받고 움츠러드는 대신 표현하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싸우고 화내는 대신 허허 웃고 둥글게 내어놓을 수 있다면, 갈등 또한 자연스레 왔다 가지 않을까.
십여 년간 드문드문 요가를 하다가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땄다. 나는 별로 유연하거나, 요가를 잘하지 않는다. 꾸준히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내게 요가는 생존이었다. 가둬둔 마음들을 움직임으로 흘려보내야 했다. 음악과 함께 움직이면서 춤추는 듯 자유로웠고, 나는 듯 가벼웠다. 하루는 요가를 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마음의 멍울은 몸을 굳어지게 했고, 그 굳어진 부분에 자극이 가니 저절로 눈물이 났다. 그리고 깨닫는 진실이 있었다.
‘나는 나를 정말 몹시도 미워했구나. 그러니 안 아플 재간이 있나.’
요가에는 그런 힘이 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사랑하게 한다. 그러면서 내 몸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깨닫는다. 숨어있던 내 몸의 다양한 능력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느리지만 쉼 없는 움직임으로 몸과 마음의 근육이 붙고 유연해진다.
열세 살 사춘기 아이들 역시 자신의 외모에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 아이들과 함께 요가를 하며 내 몸을 충분히 움직이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학기 초 우리 반 스포츠클럽 종목을 정하는 날이었다. 늘 그렇듯 피구나 축구 등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체육 놀이를 접하지만, 아이들에게 체육은 여전히 ‘공으로 하는 경기’를 의미했다. 그런 아이들이 과연 요가를 좋아할까?
“선생님은 요가를 좋아해. 같이 해 볼 사람……?”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물었다. 웬걸, 생각보다 많았다. 한두 명만 지원해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생각이었는데 남학생 둘, 여학생 다섯, 총 일곱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우리 반 스포츠클럽 중 하나로 요가 동아리를 시작했다. 교실에서 하기엔 공간이 좁았고, 특히 사춘기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빈 교실을 찾아가 매트를 깔고 요가 놀이를 시작했다.
“선생님, 우리 요가해요!”
“정말? 놀러 안 나가고?”
놀이 시간에 놀지 않는 아이들이라니. 그게 참 이상하고 신기했다. 요가는 아이들에게 가장 재밌는 놀이가 되었다.
학기 말에는 ‘인사이드 플로우(Inside flow, 팝송이나 대중음악에 맞춰 요가 동작을 부드럽게 이어가는 현대요가)’를 연습해 축제 공연을 했다. 학교 공연으로는 새로운 시도였지만, 감각적인 음악과 함께하는 요가는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이었다. 아이들은 공연을 위해 방과 후에 틈나는 대로 모여 연습을 했다.
그중 지환이는 단연 히어로였다. 섬세한 손끝과 호흡으로 가사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 처음에는 ‘요가가 뭐야? 남자도 요가를 해?’라고 말하던 어린이 관객들도 이내 공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가 생각났다. 지환이는 과격하고 경쟁적인 체육이 싫다고 말하던 남자아이였다.
“운동을 싫어하던 제가 요가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요가로운 삶’을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학기 말에 지환이가 이런 글을 남겼다.
‘선생님 덕분에 나를 예전보다 훨씬 사랑하게 되었다.’
나의 한 해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