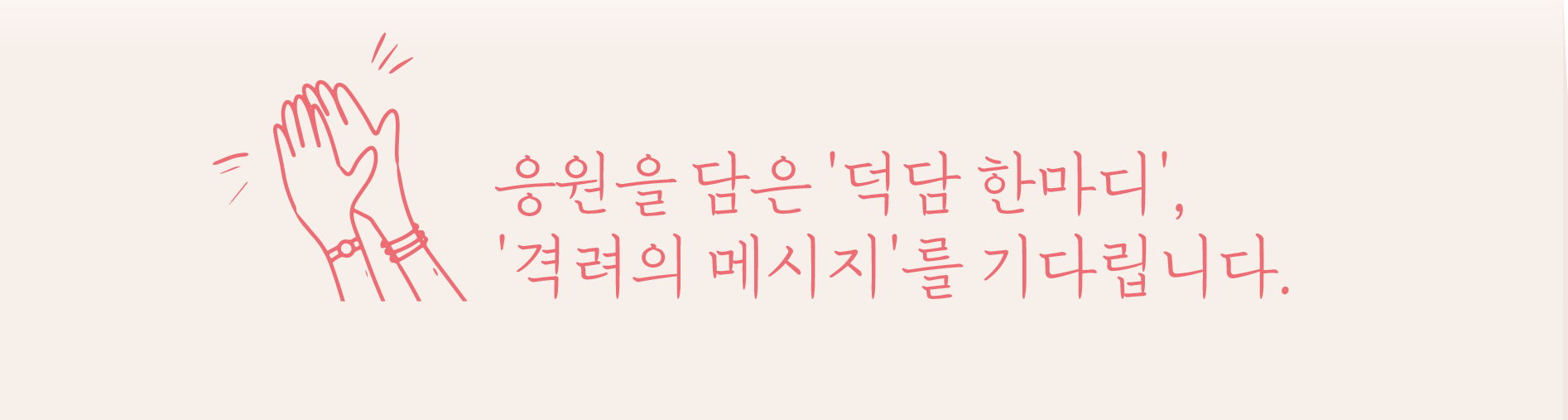
새마을 청소년학교 담임선생님
작성자 조*표
2024-05-02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때 형님께서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새마을 청소년 중학교에 갈 것을 권유했다. 형님의 입장에서 가까운 거리지 사실 한 시간 정도를 걸어서 산을 몇 개 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래도 정식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못지않게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한 시간 정도 시골 길을 걸어서 가려면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던 시절이다.
“얘들아, 내일은 간편복 입고 오거라.”
매주 토요일 오후면 떠나는 담임 선생님과의 등산이 싫었지만 호랑이 선생님의 말 한 마디에 일제히 “예”라는 짧은 대답만을 하고 교실을 나와서야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야, 또 거기 가냐. 선생님은 산 좋아하면 혼자나 가시지 왜 우리들을 데리고 간다냐?”
까까머리를 한 충청도 시골 중학생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과의 등산 동행이 싫은지 모두들 한마디씩 했다.
담임 선생님은 등산을 좋아하셔서 토요일만 되면 수업을 마친 후 계룡산 자락에 있는 폭포며 암자며 닥치는 대로 우리들을 끌고 다니셨기에 정말 유격훈련이라도 받는 느낌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우리들이 들고 있는 가방 몇 개를 불끈불끈 들어주었고 체력이 딸려 뒤에 쳐지는 아이들은 등에 업고 한참을 가기도 했다. 산 중턱에 오를 쯤 당시 유행했던 보름달 빵과 크림빵에 환타까지 잔뜩 준비해 오셔서 한바탕 잔치판을 벌였다. 선생님의 배낭은 보물 보따리였다. 맛있는 간식을 먹는 즐거움에 출발 전에 늘어놓았던 불평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신이 나서 “선생님, 다음 주에도 산에 와 유?”라고 여쭤보면 “그래.”라고 말씀하시며 빙긋이 웃었다. 산중턱에서의 간식은 1절에 불과했다. 산 정상쯤에 오르면 담임 선생님께서 손수 라면을 끓여 주셨다.(당시에는 산에서 공공연히 취사를 했었다.)
“우와, 너무 맛있어요.”
“후르륵 쩝쩝” 소리를 내며 라면 한 가닥이라도 더 먹으려고 서로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국물까지 시원하게 먹어치웠다. 배고픈 시절, 빵과 라면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귀한 존재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힘이 들 때면 가끔씩 두 분의 선생님이 불쑥불쑥 생각날 때가 있다. 당시에는 모든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텐데 물심양면으로 제자를 위해 헌신 봉사하셨던 두 분의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곤 한다.
6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과 새마을 청소년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빠 같고 삼촌 같은 부드럽고 편한 모습으로 교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때까지 오늘도 때로는 구름을 주고 때로는 밝은 햇볕, 맑은 바람을 주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될 것을 조용히 다짐해본다.
“얘들아, 내일은 간편복 입고 오거라.”
매주 토요일 오후면 떠나는 담임 선생님과의 등산이 싫었지만 호랑이 선생님의 말 한 마디에 일제히 “예”라는 짧은 대답만을 하고 교실을 나와서야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야, 또 거기 가냐. 선생님은 산 좋아하면 혼자나 가시지 왜 우리들을 데리고 간다냐?”
까까머리를 한 충청도 시골 중학생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과의 등산 동행이 싫은지 모두들 한마디씩 했다.
담임 선생님은 등산을 좋아하셔서 토요일만 되면 수업을 마친 후 계룡산 자락에 있는 폭포며 암자며 닥치는 대로 우리들을 끌고 다니셨기에 정말 유격훈련이라도 받는 느낌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우리들이 들고 있는 가방 몇 개를 불끈불끈 들어주었고 체력이 딸려 뒤에 쳐지는 아이들은 등에 업고 한참을 가기도 했다. 산 중턱에 오를 쯤 당시 유행했던 보름달 빵과 크림빵에 환타까지 잔뜩 준비해 오셔서 한바탕 잔치판을 벌였다. 선생님의 배낭은 보물 보따리였다. 맛있는 간식을 먹는 즐거움에 출발 전에 늘어놓았던 불평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신이 나서 “선생님, 다음 주에도 산에 와 유?”라고 여쭤보면 “그래.”라고 말씀하시며 빙긋이 웃었다. 산중턱에서의 간식은 1절에 불과했다. 산 정상쯤에 오르면 담임 선생님께서 손수 라면을 끓여 주셨다.(당시에는 산에서 공공연히 취사를 했었다.)
“우와, 너무 맛있어요.”
“후르륵 쩝쩝” 소리를 내며 라면 한 가닥이라도 더 먹으려고 서로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국물까지 시원하게 먹어치웠다. 배고픈 시절, 빵과 라면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귀한 존재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힘이 들 때면 가끔씩 두 분의 선생님이 불쑥불쑥 생각날 때가 있다. 당시에는 모든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텐데 물심양면으로 제자를 위해 헌신 봉사하셨던 두 분의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곤 한다.
6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과 새마을 청소년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빠 같고 삼촌 같은 부드럽고 편한 모습으로 교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때까지 오늘도 때로는 구름을 주고 때로는 밝은 햇볕, 맑은 바람을 주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될 것을 조용히 다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