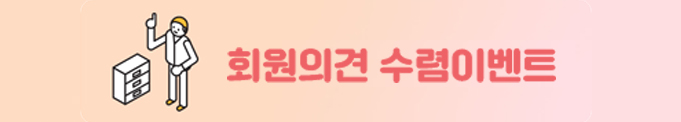배움 더하기
인생 이모작
동화로 키우는 아이들의 꿈과 삶의 지혜
‘동화책 읽어주는 할머니’ 최영학 회원
둘, 셋만 모이면 끝없이 재잘거리고 깔깔대는 아이들부터 마을 노인정에 모여 고생하던 시절 얘기로 외로움을
달래는 어르신들까지. 최영학 회원은 버스를 타고 이 학교 저 학교, 멀리 있는 마을회관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배움이나 가르침은 끝이 없고, 사회 참여
기회도 한계가 없다”라고 답한다.
글 이성미 / 사진 이용기

아이들에게 동화처럼 꿈과 희망을 전하는 동화책 할머니
“여러분, 안녕~”삽교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문이 열리자 아이들 눈이 한 곳에 쏠린다. 가방을 멘 할머니 한 분이 익숙한 듯 교실에 들어선다. 가방을 열고 동화책과 놀잇감을 꺼내자 아이들 눈이 반짝인다. 학교를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는 예산에서 ‘동화책 읽어주는 할머니’로 알려진 최영학 회원이다.
그는 교탁 앞에 서서 맨 처음 아이들에게 동화책 뒷면을 보여준다. 어떤 내용일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번에는 전면에 적힌 제목을 소리 내 읽고 다시 한번 아이들의 상상력을 불러낸다.
오늘의 동화책은 카도노 에이코의 「난 병이 난 게 아니야」다. 책 내용에 따라 그가 책상을 두드려 ‘똑똑’ 노크 소리를 내자 아이들도 책상을 따라 두드리며 즐거워한다. 커다란 곰이 나타나는 대목을 읽어주자 이번에는 숨을 죽인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놀라움과 웃음이 번갈아 튀어나온다.
책 읽기가 끝나자 그는 아이들과 “나는 내가 정말 좋아” 하며 손뼉을 친다. 손 유희를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여준다. 동화책 한 권을 읽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은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고,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 사는 지혜를 배운다.
최영학 회원이 동화책으로 아이들과 만난 건 올해로 15년째다.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예산도서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탐방 오는 걸 알고 “동화책 한 권 읽어주고 싶다”라고 제안한 것이 시작이다. ‘예산도서관의 명물! 그림책 읽어주는 퇴직 교사’라는 도서관의 적극적 홍보로 그는 ‘동화책 읽어주는 할머니’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사이 ‘예산도서관의 명물’에서 ‘예산의 명물’로 활동 무대도 더 넓어졌다.


마을 유일의 대졸자, 학생들을 만나다
최영학 회원이 평생 교육에 열성적인 이유는 어릴 적 배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부모는 교육이라고는 모르는 농사꾼이었다. 그 탓에 그는 초등학교도 뒤늦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열의와 재능이 뛰어났던 최영학 회원은 고향 예산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서 공부했다. 고등학교때는 가정교사 일을 하고, 대학교는 장학금으로 어렵게 졸업한 뒤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교편을 잡았다.초임 교사 시절, 최영학 회원은 시골의 작은 사립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며 학생들과 만났다. 그는 교실에 들어서면 ‘가난과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 나는 공부한다’라고 쓰며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떠올리며 “성적과 등수를 올려라”라고 학생들을 퍽 닦달하기도 했다. 그러다 1985년, 상담교사 연수를 받고 학생 진로 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최영학 회원의 교직 생활은 확 달라졌다. 성적 올리기에만 몰두하던 그가 ‘학생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아이는 어떤 재능이 있는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는 “그때 비로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철이 들었다”라고 회상한다. 그리고 2000년, 교단을 떠나며 그는 더 많은 아이의 꿈을 지원하기로 다짐했다.



덕분에 최영학 회원이 하는 일도 점점 많아졌다. 그는 현재 여러 기관에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재능 기부 활동도 한다. 교육 여건이 좋지 않거나 당시 사회 분위기 상 여자라서 공부하지 못한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문해 교육도 하고 있다. 동화를 좋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학부모들과 함께 동아리 ‘동화바라기’도 만들었다. 동아리 회원들은 작품 「금도끼 은도끼」, 「빨간 모자」 등을 바탕으로 교육용 인형극을 만들어 지역 축제, 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공연을 한다.
최근에는 ‘생명지킴이’ 활동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 생명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사람 마음 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새롭게 심리와 타로 공부도 하고 있다. 그는 “생소한 것을 익히는 일이 어렵기도 하지만, ‘배움’이란 여전히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라며 맑게 웃는다.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사회 참여
사람들은 최영학 회원에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최영학 회원은 ‘봉사’라는 말에 고개를 젓는다.“봉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사회 참여죠. 인간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도 길어지고 있죠.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건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또 사회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최영학 회원은 특히 “역량있는 선생님들이 퇴직 후에 재능을 발휘하지 않고 단조롭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생교육에 도전하라”라고 제안한다. 무언가 도전한다는 것은 분명 걱정이 따르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으니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영학 회원도 새로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노인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골의 각 노인정에 보급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가 늘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다시 도전하는 이유는 자신을 바라보며 먼 훗날의 삶을 그려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길을 걷다 보면 교복 입은 학생이 와서 꾸벅 인사를 해요. 한 번은 ‘누구니?’ 하고 물었더니 ‘동화책 할머니! 저 유치원 때 동화책 읽어주셨잖아요. 저도 커서 어른이 되면 꼭 그 일을 하려고 해요. 동화책 할머니는 제 롤모델이에요’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사회 참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최영학 회원은 동화책을 읽으며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문해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자신의 퇴직 이후 삶에도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 일을 오래 했더니 이제는 마치 동화 속에 사는 듯도 하다. 동화책 맨 마지막에 적힌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말처럼 최영학 회원은 앞으로도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생소한 것을 익히는 일이
생소한 것을 익히는 일이어렵기도 하지만,
‘배움’이란 여전히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재능을 기부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고 있는 회원님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전해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