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박미경 | 사진 성민하
배움의 새싹
> 꿈지락(꿈知樂)
2030 교직·의학 등에 종사하는 젊은 회원들의 꿈을 찾는 현장
꿈지락(꿈知樂)
의료의 숲에서
사랑의 꽃을 피우다
세브란스병원 수술간호팀 김진수 간호사

병원을 여행하는 청년 간호사
“고맙습니다.” 일터에서 김진수 간호사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의식을 되찾은 환자들이 자신에게 그 말을 건네올 때마다
그는 번번이 처음 듣는 말처럼 가슴이 뭉클하다. 그의
근무지는 마취회복실이다. 수술을 마친 환자가 무의식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바로 그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의
숭고함을 그는 새삼 되새긴다. 수술실은 생과 사를 오가는
의료 현장의 최전선이고, 회복실은 그곳에서 돌아온 환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날 때까지 머무는 곳이다. 비록 잠시 스치는
인연들이지만, 그들을 대하는 순간 그의 가슴엔 오직
‘진심’뿐이다.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느라 화장실을 제때 못 가거나 물을
못 마실 때도 있어요. 늘 힘들지만 생명을 살리는 제 직업이
저는 정말 좋아요.”
그가 간호사를 ‘천직’으로 여기게 된 건 세계 곳곳의 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온 것과 관계가 깊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남’과 ‘만남’을 통해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과 ‘여행’이라는 다소 낯선 조합의 단어들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온 의료인이자 여행자다. 모두 30개국
70여 도시의 병원을 탐방했다. 그동안 어떤 목적의 병원이
있고, 어떤 풍경의 병원이 존재하는지, 그곳들의 진료 환경은
어떠하며,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왔다. 그 생생한 이야기를 『청춘 간호사의 세계 병원 여행』이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여행 산문집의 옷을 입은 ‘세계
의료 보고서’다.
“인도 첸나이가 출발점이에요. 간호학과 2학년 때 봉사 활동을
했던 곳으로 병원은 커녕 학교 안에 보건실도 없는 마을이었어요. 아이들이 맨발로 돌아다녀 상처가 아주 많더라고요.
손으로 식사하는 나라인데 손 씻는 문화도 형성돼 있지 않았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이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상처를 치료해 주고 위생 교육도 해주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자신이 배운 손 씻기 방법을 동생한테
가르쳐주는 걸 봤어요. 이렇게 전파하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전 세계 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싶다는 소망이 그때 생겼어요.”




여행이 바꿔준 나의 꿈
이듬해엔 미얀마의 작은 수도승 마을로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인도 첸나이에서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번엔 학생과 수도승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쳤다. 그날 저녁, 한 동자승이
그에게 한 말을 그는 잊지 못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이었어요.” 실습용 마네킹을 챙겨 오느라 겪었던 어려움이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졌다. 이후 그의 여행 일정엔 언제나
의료 현장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 시작한 병원 여행은
유럽과 미국을 거쳐 남미 대륙으로 이어졌고, 그 여행은 단지
전 세계 병원을 ‘보는’ 것을 넘어 현지의 의료진을 ‘만나는’ 것으로
이어졌다. 오래전 간호사 면허만 있을 뿐 아직 실무를
시작하지 않았던 시기에 런던의 세인트 토머스 병원(St. Thomas’ Hospital)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병원 곳곳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던 간호사의 따뜻한 마음을 그는
요즘도 가끔 떠올린다. 남미 여정에서는 갑작스러운 비행기
파업으로 우연히 들르게 된 아르헨티나의 한 지역 병원에서
그곳 의사의 안내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 볼 기회를 얻기도 했다. 떠나지 않았다면 미처 하지 못했을 경험들로
그는 ‘용기’와 ‘패기’를 얻었다. 지난해 6월엔 아프리카
모리셔스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나,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현지
병원을 둘러보고 왔다. 매우 아름다웠던 그 섬의 풍광만큼이나
조금 안타까웠던 그곳의 의료 환경이 그의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
“미국 뉴저지의 잡 헤인스 홈(Job Haines Home)이 잊히지
않아요. 뉴욕에서 어학 연수를 할 때 방문한 요양병원인데,
그곳 환자들은 환자복 대신 평상복을 입어요. 1인 1실로 운영되는
병실엔 자신이 평소에 쓰던 물건들로 채워져 있고요.
병원이라기보다 집에 가까워요.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렴풋이 보이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의 아름다운 센강에 위치한 아다망 병원(L’adamant
Hôpital)도 환자를 위해 헌신하던 간호사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모든 병원에서의 경험은 목적이나 풍경은
달랐어도 간호사라는 직업에 사명감을 더해줬다. 꿈도 그
길에서 얻었다.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일조하는 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과정에도 입학했다.
‘사적’이었던 병원 여행이 그를 점점 ‘공적’ 영역으로 데려간다.
그 사실이 그는 꽤 마음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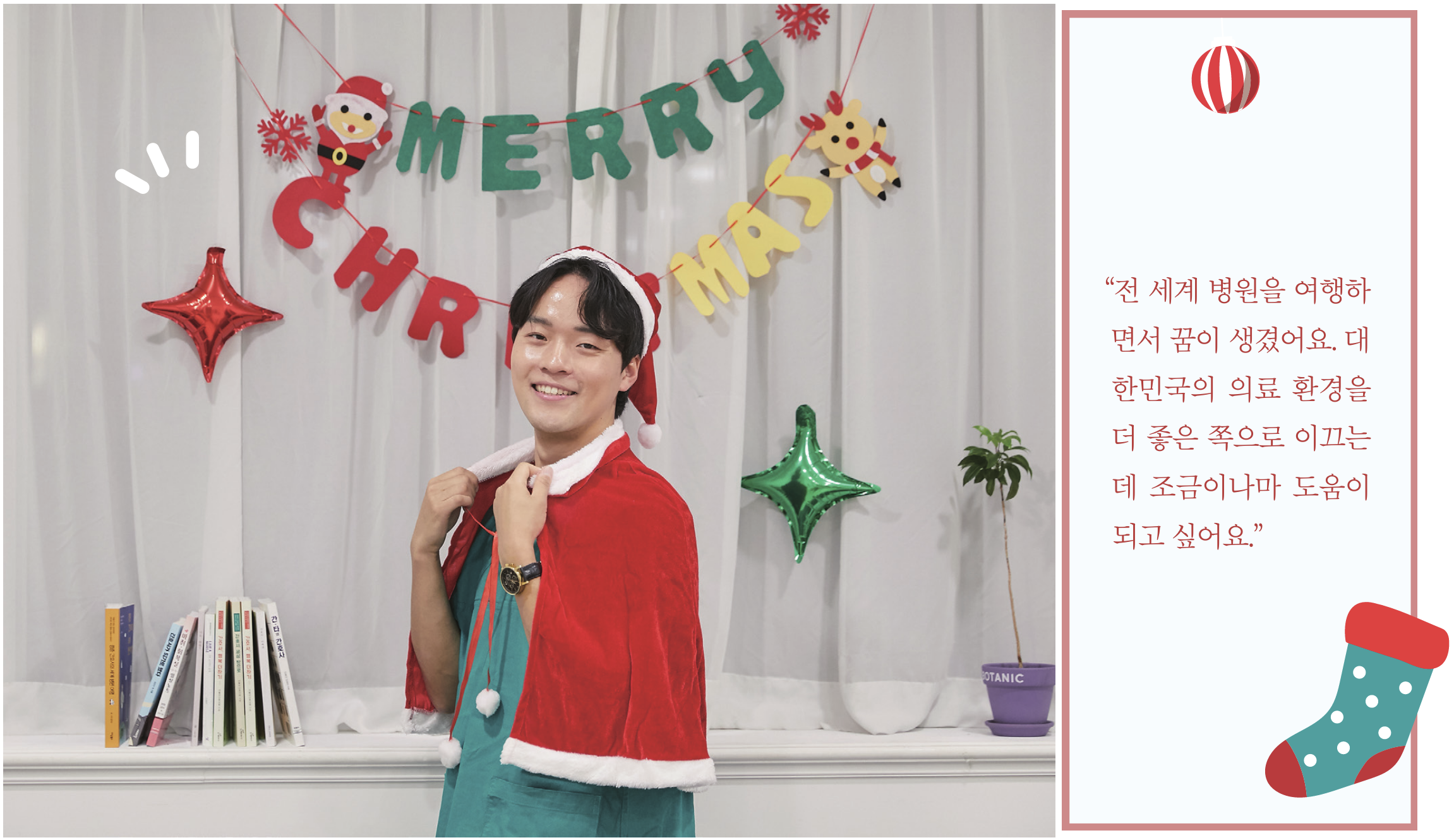

“전 세계 병원을 여행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을 더 좋은 쪽으로 이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나눌수록 단단해지는 행복
공적인 그의 영역 가운데는 선배 간호사로서의 ‘길잡이’ 역할도 있다.
8년 차 간호사인 그는 과거 ‘금남’의 영역으로 통하던
간호사 직군에서 어려움과 보람을 온몸으로 겪어왔다. 그 이야기를
엮어 책도 쓰고 강연도 한다. 이 직업을 택한 후배들이
자기만의 빛나는 서사를 쌓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까지 자신의
이야기가 한 줌 도움이 되기를 그는 희망한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남자 간호사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 병원의 남자 간호사는 약 300명이에요. 잘 적응하지 못하는
후배들을 돕기도 하고, 힘을 모아 ‘좋은 일’을 하기도 해요.
지난 5월에는 인형 탈을 쓰고 어린이병원 환아들과 신나게
놀아줬어요. 연말엔 병원 인근 이웃들을 위해 연탄 배달을 함께할
거고요.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서 참 행복해요.”
그의 삶은 갈수록 ‘산타클로스’를 닮아간다. 사람을 사랑하는
청춘의 굴뚝에 희망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